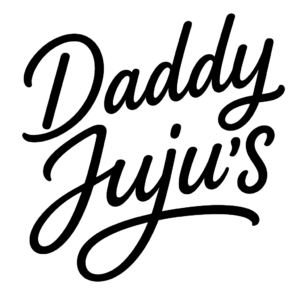문제는 그 이후였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이건 글이 아니었다. 나의 글도 아니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보도 아니었다. 나는 정보를 가공했지만, 그 가공엔 영혼이 없었다.
내가 다루는 주제는 건강이었다. 누군가의 절실함이 담긴 키워드였다. 그런데 나는 광고 수익을 위해 글을 만들고 있었다. 애드센스를 달고, 수익을 얻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만든 글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확신이 없었다. 애초에 내가 장악하지 못한 글이었고, 설명할 수도 없는 글이었다.
AI는 잘 만든다.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할루시네이션의 연속이었다. 있어 보이는 말들, 멋진 출처. 그런데 실제 페이지에선 그 내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구독을 끊었다.
진짜 글은 무엇일까. 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 시작은 ‘글’이다. 생각은 휘발되지만 글은 남는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 글이 누군가를 위한 마음에서 다시 정리되면 콘텐츠가 된다. 그리고 그 콘텐츠는 누군가를 울릴 수도 있다.
하지만 AI가 만든 글은 내 것이 아니다. 정보만을 제공하는 글이라면 AI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보를 넘어서 ‘가치’를 원한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 문제를 해결해주는 글, 혹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 진짜다.
나는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책에서 ‘기록하면서 방황한다’는 문장을 보았다. 완벽한 구조보다 중요한 건 기록의 방향성과 마음이다. AI는 글을 쓸 수 있지만, 생각은 대신할 수 없다. AI는 요약하고 질문하고 포맷팅도 잘한다. 그런데 그 글은 내 성장과는 무관하다. 글 한 편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AI 자동 콘텐츠 발행은 하지 말자. 글은 내가 써야 한다. 하루에 한 편이라도, 1시간을 투자해서라도. AI는 날마다 똑똑해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똑똑해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없지 않은가?
글은 생각이고 생각은 나다. 진짜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